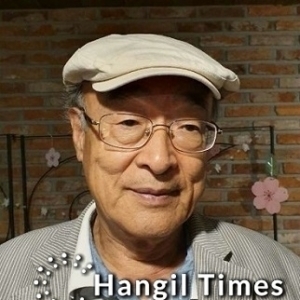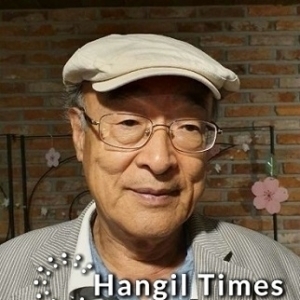[박광준 기자] 1908년 아침기도회가 열린 보구녀관.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 밑 원활한 진료를 위해 한국어 공부를 필수로 해야했다.
오래전부터 W.F.M.S.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선교 활동을 하게 될 나라의 언어를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유인즉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W.F.M.S.의 첫 여성 선교사로서 조선에 온 스크랜튼 대부인은 일본에 머물면서 한학자 이수정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웠고, 보구녀관 1대 병원장이었던 메타 하워드는 뛰어난 언어 실력으로 금세 한국어를 익혔다. 제2대 제중원 부녀과 담당의사였던 릴리어스 호튼은 메타 하워드가 스스로 언어를 익혔다고 기록했다.
새로운 선교사가 올 때마다 그들이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 일정 기간 규칙적인 공부를 했다. 1912년에 한국에 온 간호원양성학교 교장이자 간호원장인 나오미 앤더슨은 평양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웠고 보구녀관의 마지막 병원장이었던 아만다 힐만 의사 역시 언어 공부와 환자 진료를 병행하느라 무척 분주했다. 3대 병원장 로제타 홀은 한국어가 늘지 않는데다 공부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고민을 일기에 남기기도 했다.
 보구녀관 대기실이들은 과연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W.F.M.S.의 1920년대 초반 보고서 중에서 랭귀지(한국어) 스쿨 1~3학년 과정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학년마다 1~2학기를 둬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랭귀지 스쿨 과정 관련 KWC 보고서(1921)에 의하면, 이들이 활용한 교재는 한국어를 잘하는 선교사들이 쓴 책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선교사, 스톡스(Marion B. Stokes, 1882~1968) 선교사, 애니 베어드 부인(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 등이다.
보구녀관 대기실이들은 과연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 W.F.M.S.의 1920년대 초반 보고서 중에서 랭귀지(한국어) 스쿨 1~3학년 과정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학년마다 1~2학기를 둬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랭귀지 스쿨 과정 관련 KWC 보고서(1921)에 의하면, 이들이 활용한 교재는 한국어를 잘하는 선교사들이 쓴 책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16) 선교사, 스톡스(Marion B. Stokes, 1882~1968) 선교사, 애니 베어드 부인(Annie Laurie Adams Baird, 1864~1916) 등이다.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잘하는 선교사 중 한 명으로 여러 권의 한국어 교재 및 한국 관련 책을 집필했다. 스톡스는 '한국어 문법'(Korean by Clause-Method) 교재를 썼다(‘한국교회이야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kalos1079/222219790241 ).
베어드 부인은 한국어 운문체를 가장 잘 구사한 선교사로 영어 찬송가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한국 찬송가의 어머니로 불렸다‘옥성득 교수의 한국기독교역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1000oaks/220730667245 ). 이들이 남긴 한국어 관련 교재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훌륭한 교과서가 되었다.
 1900년대 초 보구녀관 간호사들이 보구녀관에 머물던 선교사 구타펠 양에게 보낸 한국어 편지. 보구녀관 간호사 및 근무자들은 선교사들과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했다.W.F.M.S. 랭귀지 스쿨의 1학년 1학기 과정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파악하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음운과 절’, ‘받아쓰기’, ‘음절 변화에 주의하며 읽기’를 배우고 나면, 스톡스 목사의 '문장 구성에 따른 한국어 1~30강', 베어드 부인의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하는 문법 수업'을 공부했다. 이후 언더우드 목사가 쓴 교재의 Part 1과 Part 2를 배우고 난 후 100개의 한국어 문장을 써서 제출하는 과제도 있었고,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읽고 쓰는 연습도 병행했다.
1900년대 초 보구녀관 간호사들이 보구녀관에 머물던 선교사 구타펠 양에게 보낸 한국어 편지. 보구녀관 간호사 및 근무자들은 선교사들과 한국어와 영어로 소통했다.W.F.M.S. 랭귀지 스쿨의 1학년 1학기 과정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파악하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음운과 절’, ‘받아쓰기’, ‘음절 변화에 주의하며 읽기’를 배우고 나면, 스톡스 목사의 '문장 구성에 따른 한국어 1~30강', 베어드 부인의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하는 문법 수업'을 공부했다. 이후 언더우드 목사가 쓴 교재의 Part 1과 Part 2를 배우고 난 후 100개의 한국어 문장을 써서 제출하는 과제도 있었고, 한글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읽고 쓰는 연습도 병행했다.
1학년 2학기로 넘어가면 스톡스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의 교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대화를 연습하면서 쉬운 성경 문구 및 기도 형식을 익혔다. 인상적인 것은 이때부터 ‘한자 100개 익히기’ 수업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베어드 부인의 'Fifty Helps'라는 교재 전체 공부를 마무리하고, 언더우드의 Part 2에 나오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공부하는 것도 1학년 2학기 때이다.
2학년 1학기에는 대화를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언더우드의 매일 한국어' 교재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솝우화, 한국지리 등에 대한 수업도 추가되고, 찬송가와 복음서 강연, 성경 이야기도 배웠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 관련 단어와 구절을 공부하며 최소 400단어를 사용해 작문을 한 뒤 랭귀지 스쿨 교사에게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다.
2학년 2학기에는 더 깊이 있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는 한자 200개 익히기와 동시에 오륜행실 등 전형적인 한국 책을 접하게 되는데, 한국의 질서나 규칙을 이해하고 신문을 읽으며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능력도 키웠다. 과제는 도우미나 전도부인 등에게 일과 관련한 지시를 적어 두 통 이상의 편지를 보내고, 그 결과를 랭귀지 스쿨 사무실에 제출하는 것이었다.
 1905년 보구녀관 정면에서 찍은 사진. 검은색 옷을 입고 보구녀관 앞에 서 있는 엠마 언스버거 의사와 흰색 모자를 쓴 마가렛 에드먼즈 간호원장.3학년 과정은 별도로 학기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수업 과정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속담을 비롯해 100개의 시사 용어 또는 구문 수업이 추가되었고, 한국인의 성(姓)씨를 한자로 읽고 쓰는 연습도 이루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성경 본문을 암기해야 했고, 로마서, 히브리서, 옥중 서신을 번역하고 설명하는 수업도 있었다. 1,500~3,000자 분량의 설교 두 편 또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제도 해야 했다.
1905년 보구녀관 정면에서 찍은 사진. 검은색 옷을 입고 보구녀관 앞에 서 있는 엠마 언스버거 의사와 흰색 모자를 쓴 마가렛 에드먼즈 간호원장.3학년 과정은 별도로 학기 구분을 하지 않았지만 수업 과정은 한층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속담을 비롯해 100개의 시사 용어 또는 구문 수업이 추가되었고, 한국인의 성(姓)씨를 한자로 읽고 쓰는 연습도 이루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어 성경 본문을 암기해야 했고, 로마서, 히브리서, 옥중 서신을 번역하고 설명하는 수업도 있었다. 1,500~3,000자 분량의 설교 두 편 또는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제도 해야 했다.
교재가 된 한국어 책들은 노블(William Arthur Noble, 1866~1945) 목사의 '조선의 이야기, 이화(Ewa, A Tale of Korea)', 언더우드 목사의 '조선의 언더우드(Underwood of Korea)', 베어드 부인의 '조선의 새벽(Daybreak in Korea)' 등 수십 권에 달했다. 선교사들은 이 책들을 학기마다 두 권 이상, 3학년 동안 총 4번을 읽고 랭귀지 스쿨 위원회에 보고해야 했다. 게다가 구두시험 등 랭귀지 스쿨 자체 시험도 따로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다.
[출처] W.F.M.S.의 선교사들은 어떻게 한국어 공부를 했을까?/이화의료원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 13] 설봉산 자락에 있는 '설봉호(설봉공원1)' [박광준 기자]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 자락에 있는 설봉공원은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의 개최지이자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이천 9경 중 한 곳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99㎢의 면적의 설봉저수지를 두르는 산책로와 문화시설, 레저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의 방문이 끊...

 태안지역 인재 육성 ‘결실’, 209명에 장학금 3억 6900만 원 전달
태안지역 인재 육성 ‘결실’, 209명에 장학금 3억 6900만 원 전달
 BBQ, 정부 요구에 치킨 가격 인상 또 4일간 늦춘다
BBQ, 정부 요구에 치킨 가격 인상 또 4일간 늦춘다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전북대 양오봉 총장, 고교생 찾아 특강 ‘전북대 세일즈’
전북대 양오봉 총장, 고교생 찾아 특강 ‘전북대 세일즈’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영화인 선정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위에 김기영 감독 '하녀'
영화인 선정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위에 김기영 감독 '하녀'
 박종태 한화이글스 신임 대표 "준비한 것 토대로 높이 비상"
박종태 한화이글스 신임 대표 "준비한 것 토대로 높이 비상"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