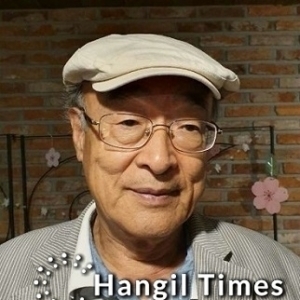이이의 율곡송[박광준 기자]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보물 제165호로 지정된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이 탄생한 곳이다. 수백 년 된 검은 대나무 오죽(烏竹)이 빽빽이 자라고 있어 이름 붙여진 오죽헌은 안채와 바깥채, 별채로 구성돼 있던 자그마한 한옥 집 전체를 오죽헌이라 하지만 기실 오죽헌은 별채의 이름이다.
이이의 율곡송[박광준 기자]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보물 제165호로 지정된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이 탄생한 곳이다. 수백 년 된 검은 대나무 오죽(烏竹)이 빽빽이 자라고 있어 이름 붙여진 오죽헌은 안채와 바깥채, 별채로 구성돼 있던 자그마한 한옥 집 전체를 오죽헌이라 하지만 기실 오죽헌은 별채의 이름이다.
오죽헌을 처음 지은 사람은 세종 때 공조참판을 지낸 최치운으로 차남인 병조참판 최응현에게 물려주었고, 뒤에 둘째 사위인 이사온에게 주었다. 그 후 이사온은 사위인 신명화에게 상속했다. 바로 신명화가 사임당의 아버지이다. 신명화는 이사온의 외동딸 용인 이씨와 결혼했다. 용인 이씨는 부모님을 봉양하려고 친정집에 살면서 딸만 다섯을 두었는데, 그 중 둘째딸이 신사임당이다.
신명화 역시 딸만 있어 재산을 물려줄 때 외손자인 이이에게는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는 조건으로 서울 수진방 기와집 한 채와 전답을 주었고, 또 다른 외손자인 권처균에게는 묘소를 살피라는 조건으로 오죽헌 기와집과 전답을 주었다.
 율곡 이이상
율곡 이이상
그 때 집을 물려받은 권처균이 집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했다. 그것이 후에 오죽헌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여성으로서 신사임당만큼 존경받는 인물도 없다.
신사임당은 강원도 강릉 북평촌에서 서울 사람인 신명화와 용인 이씨 사이의 다섯 딸 중 둘째딸로 태어났다.
신사임당 아버지 신명화는 고려 태조 때 건국공신인 신숭겸의 18세손으로 과거시험에 응시하지 않다가 마흔이 넘어 진사가 됐을 뿐 벼슬을 사양하고 오직 학문에 전념해 다행히 기묘사화에도 화를 당하지 않았다.

이런 그가 강릉사람으로 최응현의 손녀인 용인 이씨와 결혼해 강릉에서 살았다.
신사임당의 어머니인 용인 이씨는 아버지 이사온이 최응현의 사위로 오죽헌을 물려받아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출생했다. 그가 신명화와 결혼하지만 외동딸인 자신을 시집보내고 외롭게 살아가실 부모를 위해 봉양하기로 하고 오죽헌에 함께 살게 된다. 그 때 신사임당을 비롯한 딸 다섯을 낳게 된다.
신사임당 역시 딸만 다섯 나신 부모님을 위해 결혼하고도 오죽헌에 20년간 살면서 아들 율곡 이이를 낳았다. 이렇게 시집 간 딸이 친정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낳는 일은 조선 전기의 가족문화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다.
오죽헌 매표소를 지나 들어서면 초충공원이 펼쳐져 있다. 오른쪽으로는 빽빽한 소나무 동산이 보이고 입구를 지나자 율곡의 동상이 보인다. 조형물을 지나 사임당의 초충도를 재현해 놓은 조형물이 있다.
 오죽헌
오죽헌
 오죽헌 현판 오죽헌은 본채인 안채와 바깥채가 있다. 안채는 안주인이 기거하던 곳이고 바깥채는 사랑채로서 바깥주인의 처소로, 아담한 안채 앞마당은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있어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든다.
오죽헌 현판 오죽헌은 본채인 안채와 바깥채가 있다. 안채는 안주인이 기거하던 곳이고 바깥채는 사랑채로서 바깥주인의 처소로, 아담한 안채 앞마당은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있어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든다.
사랑채인 바깥채 툇마루 기둥에는 멋진 필체의 주련이 걸려 있는데 추사 김정희의 글씨라 한다. 그 바깥채의 오른편으로 전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지붕으로 된 전각이 바로 별채인 오죽헌이다.
그 외에 경내에는 문성사와 어제각, 율곡기념관, 강릉박물관 등이 있다. 문성사(文成祠)는 율곡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 1976년 오죽헌 정화사업으로 건립됐고, 현판의 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이고 영정은 이당 김은호가 그렸다. ‘문성’은 1624년 인조임금이 율곡선생에게 내린 시호이다.
오죽헌의 맨 왼편으로는 어제각이 있다. 어제각은 1788년 정조임금이 율곡의 벼루와 격몽요결을 궁궐로 가져오게 해 친히 벼루 뒷면에는 율곡을 찬양하는 글을 적고 책에는 머리글자를 지어 보내면서 강원도 관찰사에게 전각을 지어 책과 벼루를 보관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어제각이다. 격몽요결은 보문 제602호이고 원본은 강릉시립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어제각
어제각
 어제각 내부
어제각 내부
또한 수령이 600년이 넘는 배롱나무는 아직도 때가 되면 꽃이 피어 백일 동안 그 자태를 자랑하고 있고 문성사 오른쪽으로는 두 그루의 율곡송(栗谷松)이 우아하면서도 멋들어진 자태를 뽐내고 서 있다. 그리고 신사임당과 율곡이 직접 가꾸었다는 천연기념물 제484호인 매화나무 율곡나무가 있다.
오죽헌을 돌아 전면으로 빠져나오면 드넓은 정원이 조성돼 있다. 또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돼 있어 한눈에 관동지방의 역사와 풍습을 볼 수 있다.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천재 화가로, 본명은 신인선이고 그의 호는 사임당이다. 그는 7살 때부터 스승 없이 그림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는 풀벌레와 포도를 그리는 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어느 날 열 살도 채 안된 여자아이가 대청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당시 사대부며 명문가들은 매(梅), 란(蘭), 국(菊), 죽(竹) 사군자(四君子)를 즐겨 그렸지만, 이 여자아이가 그리는 것은 오이, 가지, 포도, 수박 등의 과실과 나비, 벌, 메뚜기, 개구리 같은 벌레들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아이가 그림을 그리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당에서 노닐던 수탉이 대청으로 올라와 그림을 다 쪼아 버리자 돌아와 그 광경을 본 아이가 속이 상해 엉엉 울자, 인자한 아버지는 “얘야, 그것은 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인 것 같구나. 저 닭도 네 그림속의 채소며 벌레들이 진짜인줄 알고 쫀 것이 아니겠느냐? 비록 이리 찢겨버리긴 했지만 네 솜씨가 하도 훌륭하여 내 사랑방에 걸어 놓고 두고두고 네 솜씨를 감상해야겠구나.”라고 했다.
 신사임당상그 아이가 바로 훗날 우리나라 최고 여류화가요 겨레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다.
신사임당상그 아이가 바로 훗날 우리나라 최고 여류화가요 겨레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다.
부친 신명화와 모친 이씨 부인의 다섯 딸 중 둘째로 태어난 사임당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재능을 보였다. 그런 재능은 할머니 최씨와 어머니 이씨와 더불어 살면서 시와 그림, 글씨 등을 전수 받아 생긴 것이다.
신사임당은 산수화는 물론이고 수박, 오이, 가지 등의 다양한 채소들과 개구리, 쥐, 메뚜기, 나비 등의 벌레들을 담은 여덟 폭 병풍 초충도를 남겼다. 당시 초충도는 그 정교함과 현실감 있는 필채와 세필(細筆) 등으로 세간에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사임당이 이원수와 19세 때인 1522년에 결혼한다. 이 후 21세 때 맏아들 선, 26세 때 둘째 매창, 33세 때 셋째인 율곡 이이를 낳는 등 모두 4남 3녀를 낳아 키웠다. 그는 결혼하자마자 부친이 돌아가시자 3년 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와 시가인 파주 율곡리에서 기거하기도 했으나,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부모님을 위해 어머니 이씨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가서 살지 않고, 주로 강릉 친정집에 20여 년간 살았다.


그가 38세 되던 해 시집살림을 위해 서울로 올라와 수진방(지금의 청진동)에서 살다가 48세에 삼청동으로 이사했다. 그 때 남편이 수운판관에 임명돼 아들들과 함께 평안도로 갔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 때 이이의 나이 16세로 어머니를 여의자 금강산에 들어가 입산할 정도로 방황했다.
아들 율곡이이는 율곡전서 사임당행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소에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 7세 때 벌써 안견(安堅)의 그림을 본받아 산수도(山水圖)를 그렸다. 특히 포도그림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린 병풍이나 족자는 세상에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기록해 어머니를 그리워 했다.
사임당은 아들 율곡 이이 덕분에 정경부인에 증직됐고 그 유산으로는 탄생지인 오죽헌과 묘소가 있는 조운산이 있다.
 강릉 로죽헌 율곡매사임당 신씨는 중종 17년인 1522년 19의 나이로 덕수이씨(德水李氏) 이원수(李元秀)공에게 출가해 슬하에 4남3녀 칠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 셋째 아들 이(珥)가 바로 율곡이다.
강릉 로죽헌 율곡매사임당 신씨는 중종 17년인 1522년 19의 나이로 덕수이씨(德水李氏) 이원수(李元秀)공에게 출가해 슬하에 4남3녀 칠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 셋째 아들 이(珥)가 바로 율곡이다.
1536년(중종 31년). 사임당 나이 33세 이른 봄. 꿈에 동해에 이르니 선녀가 바다 속으로부터 살결이 백옥 같은 옥동자 하나를 안고 나와 부인의 품에 안겨주는 꿈을 꾸고 아기를 잉태해 같은 해 12월 26일 새벽, 검은 용이 바다로부터 날아와 그녀의 침실에 이르러 문머리에 서려 있는 꿈을 꾸고 아기를 낳으니 그가 바로 율곡이다.
그래서 율곡이 태어난 방을 몽룡실(夢龍室)이라 한다. 몽룡실은 전면 세 칸 측면 두 칸인 별채 오죽헌의 오른쪽에 있는 온돌방으로, 율곡이 일곱 살까지 살면서 성장했던 오죽헌은 율곡에게 학문의 기초를 다져주었던 신사임당과 함께 율곡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성장기에 어머니에게 배운 모든 것들이 바탕이 돼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를 하면서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칭송됐고, 이후 수많은 관직을 거치면서 당대 최고의 유학자이며 대정치가 됐다.
 사임당 배롱나무후일 율곡은 송시열 등 성리학자들의 정신적인 스승이 됐고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도 당대 최고의 화가에서 율곡을 훈육한 훌륭한 어머니로 더 큰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현모양처의 훌륭한 여성의 대표로서 현재까지 위대한 어머니 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사임당 배롱나무후일 율곡은 송시열 등 성리학자들의 정신적인 스승이 됐고 율곡의 어머니인 사임당도 당대 최고의 화가에서 율곡을 훈육한 훌륭한 어머니로 더 큰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현모양처의 훌륭한 여성의 대표로서 현재까지 위대한 어머니 상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사임당에 관한 기록은 대관령 정상에 세워진 사임당의 시비(詩碑)이다. 이 시비는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남긴 칠언절구(七言絶句)의 한시(漢詩) “늙으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고 외로이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 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 내리네”로 그녀의 효심을 읽을 수 있다.
이 효심을 비롯한 시(詩 ), 서(書), 화(畵)에 뛰어난 화가로서 또 율곡 이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글을 가르쳐준 이는 어머니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율곡의 스승이었던 신사임당을 기리기 위해 강릉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984년 건비문(建碑文)을 세웠다.
[철도역 이야기 12] 시작의 역사 인천역 [이승준 기자] 한반도의 철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침략적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초창기 대부분 철도 역사들은 임시가설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놓여진 인천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인선 철도 부설이 미국인 J.R.Moise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천 역사는 미국 철도역 사의 구성형식에 영향을 ...

 당진 현대제철 명장연구회, 당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교실 게시판 후원
당진 현대제철 명장연구회, 당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교실 게시판 후원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으로 현장 안전 일터 조성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으로 현장 안전 일터 조성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주)소소생생 법인 출범’과 소상공인 전용폰 독점 계약 체결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주)소소생생 법인 출범’과 소상공인 전용폰 독점 계약 체결
 대법, 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유죄 학정
대법, 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유죄 학정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최연소 위촉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최연소 위촉
 한국타이어, UEFA 유로파리그 및 유로파컨퍼런스리그 공식 파트너십 3년 연장
한국타이어, UEFA 유로파리그 및 유로파컨퍼런스리그 공식 파트너십 3년 연장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사랑을 받는 논산의 자랑거리 ‘탑정호’
사랑을 받는 논산의 자랑거리 ‘탑정호’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