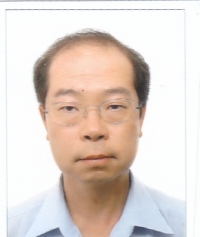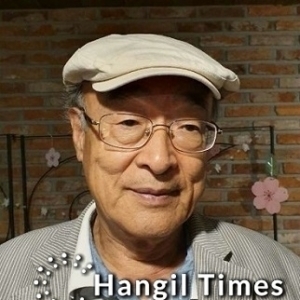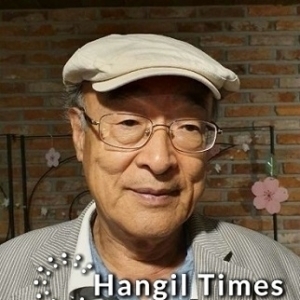사진/이승준 기자[이승준 기자] 숭례문은 조선시대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일명 남대문(南大門)이라고도 하다. 서울 도성의 사대문 가운데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1호로 지정됐다.
사진/이승준 기자[이승준 기자] 숭례문은 조선시대 도성을 둘러싸고 있던 성곽의 정문으로, 일명 남대문(南大門)이라고도 하다. 서울 도성의 사대문 가운데 남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1호로 지정됐다.
서울 숭례문은 1396년(태조 5) 축조된 서울도성의 정문으로, 1398년(태조 7) 2월에 준공됐다. 이 후 1448년(세종 29) 개수공사가 완료됐고, 1961년부터 1962년 사이에 실시된 해체수리 때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에서 1479년(성종 10)에도 대대적인 중수공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건물로, 화강암으로 구축한 홍예형(虹霓形)의 누기(樓基)와 마름석축으로 이뤄진 기층의 중앙에 홍예문이 있고 판문에 철갑을 씌운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건물로, 화강암으로 구축한 홍예형(虹霓形)의 누기(樓基)와 마름석축으로 이뤄진 기층의 중앙에 홍예문이 있고 판문에 철갑을 씌운 두 짝의 문이 달려 있다.
석축기단 윗면에는 전돌로 쌓은 여장(女墻)을 돌리고 동서 양쪽에 협문을 한 개씩 두어 계단을 통해 오르내릴 수 있게 했고, 문의 앞뒤 여장 밑에는 석루조(石漏槽)를 4개씩 설치했다. 기단의 양측에는 원래 성벽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1908년 길을 내기 위해 헐어내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
사진/이승준 기자
건물 내부의 아래층 바닥은 홍예의 윗면인 중앙간만이 우물마루일 뿐, 다른 칸은 흙바닥으로 돼 있고 위층은 널마루이다. 기둥은 모두 굵직한 두리기둥인데, 기둥뿌리에 나직한 하방(下枋)을 걸고 기둥머리에는 키가 큰 창방(昌枋)을 걸었다. 창방과 기둥 위에는 널찍하고 두툼한 평방을 돌리고 그 위에 공포를 올렸다.
공포는 기둥 위쪽과 건물의 앞뒷면 중앙간에는 네 개씩, 다른 기둥 사이에는 두 개씩의 공간포(空間包)를 올렸고, 양 측면에도 두 개씩의 공간포를 올렸고 내외포(內外包)가 모두 이출목(二出目)이다. 위층에는 기둥 사이의 중방(中枋)과 창방 사이에 작은 창(窓)이 나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공포는 외삼출목칠포작(外三出目七包作), 내이출목오포작(內二出目五包作)이고 천장의 가구(架構)는 연등천장이다. 지붕은 아래위층 모두 겹처마로 사래 끝에는 토수(吐首)를 씌우고 추녀마루에는 잡상(雜像)과 용두(龍頭)를 올려놓았고, 용마루 양끝에는 취두(鷲頭)를 올린 우진각 지붕으로 돼 있다.
사진/이승준 기자공포는 외삼출목칠포작(外三出目七包作), 내이출목오포작(內二出目五包作)이고 천장의 가구(架構)는 연등천장이다. 지붕은 아래위층 모두 겹처마로 사래 끝에는 토수(吐首)를 씌우고 추녀마루에는 잡상(雜像)과 용두(龍頭)를 올려놓았고, 용마루 양끝에는 취두(鷲頭)를 올린 우진각 지붕으로 돼 있다.
또한 최근의 수리 결과, 원래는 팔작지붕이었고 아래위층의 살미첨차의 하향을 막기 위한 헛공아가 후세의 첨가물임이 밝혀져 제거됐고, 공포 사이의 포벽(包壁)도 토벽(土壁)으로 내외면을 단청해 연화 또는 당초문 등이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후세의 공작임을 알게 돼 제거됐다.
 사진/이승준 기자한편 편액의 필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쓴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 성문의 예자(禮字)는 오행에 배치하면 불[火]이 되고 오방(五方)에 배치하면 남쪽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른 문의 편액이 가로쓰임이나 숭례문이 세로로 쓰여 있는 것은 숭례의 두 글자가 불꽃 염[炎]을 의미해 경복궁을 마주보는 관악산의 화산(火山)에 대하는 것이라 한다.
사진/이승준 기자한편 편액의 필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지봉유설(芝峰類說)’에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이 쓴 것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 성문의 예자(禮字)는 오행에 배치하면 불[火]이 되고 오방(五方)에 배치하면 남쪽을 지칭하는 말이다. 다른 문의 편액이 가로쓰임이나 숭례문이 세로로 쓰여 있는 것은 숭례의 두 글자가 불꽃 염[炎]을 의미해 경복궁을 마주보는 관악산의 화산(火山)에 대하는 것이라 한다.
숭례문은 서울에 남아 있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 경 방화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2층 누각의 90%, 1층 누각의 10% 정도가 소실됐다. 이후 2010년 2월에 숭례문복구공사를 시작한 이래 2013년에 완공돼 시민에게 공개됐다.
 사진/이승준 기자
사진/이승준 기자
 사진/이승준 기자
사진/이승준 기자
 사진/이승준 기자
사진/이승준 기자
 숭례문 화재/사진제공=문화재청(자료사진)
숭례문 화재/사진제공=문화재청(자료사진)
[유네스코 창의도시, 이천 13] 설봉산 자락에 있는 '설봉호(설봉공원1)' [박광준 기자] 이천의 진산인 설봉산 자락에 있는 설봉공원은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이천도자기축제, 이천쌀문화축제의 개최지이자 시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다. 이천 9경 중 한 곳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99㎢의 면적의 설봉저수지를 두르는 산책로와 문화시설, 레저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여행객들의 방문이 끊...

 태안지역 인재 육성 ‘결실’, 209명에 장학금 3억 6900만 원 전달
태안지역 인재 육성 ‘결실’, 209명에 장학금 3억 6900만 원 전달
 BBQ, 정부 요구에 치킨 가격 인상 또 4일간 늦춘다
BBQ, 정부 요구에 치킨 가격 인상 또 4일간 늦춘다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전북대 양오봉 총장, 고교생 찾아 특강 ‘전북대 세일즈’
전북대 양오봉 총장, 고교생 찾아 특강 ‘전북대 세일즈’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영화인 선정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위에 김기영 감독 '하녀'
영화인 선정 역대 최고 한국 영화 1위에 김기영 감독 '하녀'
 박종태 한화이글스 신임 대표 "준비한 것 토대로 높이 비상"
박종태 한화이글스 신임 대표 "준비한 것 토대로 높이 비상"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