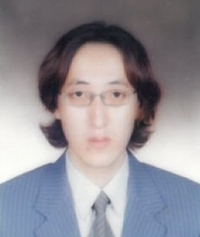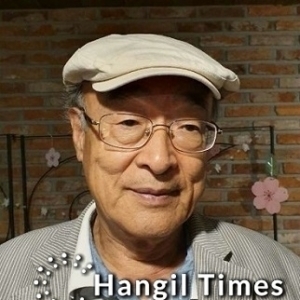은해사 괘불
은해사 괘불
[민병훈 기자]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202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보물 제1270호 ‘영천 은해사 괘불’ 및 보물 제1857호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를 전시한다. 이번 괘불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5일부터 임시 휴관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이 재개관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전시이다.
# 보물 제1270호 ‘영천 은해사 괘불’
경상북도 팔공산 자락에 자리한 영천 은해사는 809년 창건돼 천 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영천 은해사 괘불은 1750년 보총(普摠)과 처일(處一)이라는 두 명의 화승(畫僧)이 그린 것으로, 크기는 높이 11미터, 폭 5미터가 넘는다. 한눈에 담기 어려운 거대한 화면 중심에는 만개한 연꽃을 밟고 홀로 선 부처가 자리해 있다. 부처 주변에는 마치 부처를 공양하려는 듯 흐드러지게 핀 모란꽃과 연꽃이 꽃비와 같이 아름답게 흩날리는 모습이다.
 영천 은해사 전경
영천 은해사 전경
‘은해사 괘불’속 부처와 같이 홀로 서 있는 여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교주인 석가모니불로 여겨진다. 그러나 화면 주변의 화려한 꽃과 화면 윗부분의 새들의 표현은 즐거움만 가득한 곳, 즉 아미타불의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괘불 주변의 꽃은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에 찬탄하면서 뿌려진 청정한 공양처럼 볼 수도 있고, 아미타불의 극락에서 내리는 꽃비처럼 충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부처의 존명은 단정할 수 없지만 괘불 주변에 흩날리는 꽃비는 홀로 서 있는 여래를 더욱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 보물 제1857호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
이번 괘불전에는 특별히 ‘은해사 괘불’과 같은 해인 1750년에 조성된 보물 제1857호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念佛往生捷徑圖)’를 8월 23일까지만 함께 소개한다. 아미타불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염불念佛]이 극락에 태어나는[왕생往生] 가장 빠른 방법[첩경捷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불화이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특히 영천 은해사는 아미타불을 모신 미타도량으로 유명하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길 바랐던 청정한 이상향이다. 극락에 태어나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염불 수행자들, 이들을 인도하고 만나는 아미타불과 보살, 극락의 정원까지 그려진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를 통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의 찬란한 광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특히 영천 은해사는 아미타불을 모신 미타도량으로 유명하다.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길 바랐던 청정한 이상향이다. 극락에 태어나 깨달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염불 수행자들, 이들을 인도하고 만나는 아미타불과 보살, 극락의 정원까지 그려진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를 통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의 찬란한 광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은해사의 역사와 성보(聖寶)를 담은 괘불전 도록 발간
전시와 연계해 괘불전 도록도 발간했다. 매년 발간되는 괘불전 도록은 괘불과 함께 해당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도록에서는 은해사의 연혁과 사적을 정리하고, 괘불과 함께 은해사의 법당을 장엄한 ‘은해사 아미타삼존도’(1750년), ‘은해사 삼장보살도’(1755년), ‘은해사 염불왕생첩경도’(1750년) 등의 세 불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이번에 제작한 괘불전 도록을 통해 동시기 승려 장인들의 협업 모습, 불사(佛事)를 도모키 위해 계를 조직했던 동갑내기 은해사 승려들의 공덕, 팔공산 인근의 염불신앙까지 망라해 살펴볼 수 있다. 부록에는 은해사 관련 사적의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하여 경상북도의 천년고찰인 영천 은해사의 연혁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역 이야기 12] 시작의 역사 인천역 [이승준 기자] 한반도의 철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침략적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초창기 대부분 철도 역사들은 임시가설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놓여진 인천역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인선 철도 부설이 미국인 J.R.Moise에 의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천 역사는 미국 철도역 사의 구성형식에 영향을 ...

 당진 현대제철 명장연구회, 당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교실 게시판 후원
당진 현대제철 명장연구회, 당진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교실 게시판 후원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으로 현장 안전 일터 조성
HDC현대산업개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으로 현장 안전 일터 조성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주)소소생생 법인 출범’과 소상공인 전용폰 독점 계약 체결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 ‘(주)소소생생 법인 출범’과 소상공인 전용폰 독점 계약 체결
 대법, 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유죄 학정
대법, 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유죄 학정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최연소 위촉
스트레이 키즈 아이엔, 초록우산 그린노블클럽 최연소 위촉
 한국타이어, UEFA 유로파리그 및 유로파컨퍼런스리그 공식 파트너십 3년 연장
한국타이어, UEFA 유로파리그 및 유로파컨퍼런스리그 공식 파트너십 3년 연장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사랑을 받는 논산의 자랑거리 ‘탑정호’
사랑을 받는 논산의 자랑거리 ‘탑정호’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