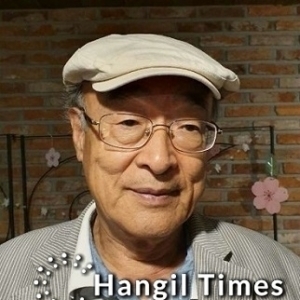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윤여금 기자] 경복궁(景福宮)은 1392년 조선 건국 4년째인 1395년(태조 4)에 창건한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法宮)으로 백악산(북악산)을 주산으로, 목멱산(지금의 남산)을 안산으로 삼아 풍수지리적인 터도 한양의 중심을 차지해 넓은 지형에 건물을 배치하였고 정문인 광화문 앞인 남쪽으로는 관청가인 넓은 육조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진 한양의 중심였다. ‘경복’의 이름은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할 것’이라는 뜻이며, 세종 대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반포되었다.
경복궁은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가 270여년이 지난 1867년(고종 4)에 다시 지어졌다. 691,921제곱미터의 대지에 약 500여동의 건물들을 건립하였으며 조선 왕실의 전통과 현실을 조화시켜 전체적으로는 규치적인 배치를 따르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중건된 경복궁은 정무공간을 중심부에 두고, 좌우 뒤편으로 왕족의 생활공간, 곳곳에는 정원시설들이 배치돼 있다.
고종 대에 건청궁과 태원전, 집옥재 등이 조성되었는데, 특히 건청궁 옥호루는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비운의 장소이다.
1910년 경술국치 후 경복궁은 계획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하여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를 개최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전각들이 철거되었고, 1926년에는 조선총독부 청사를 지어 경복궁의 정면을 막아 경관을 훼손하였다.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경복궁 복원공사가 진행되었고,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조선총독부 청사를 철거했으며 흥례문 일원, 침전 권역, 건청궁과 태원전, 광화문 등이 복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남쪽의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남쪽의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남쪽의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남쪽의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남쪽의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남쪽 궁궐의 높은 담장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남쪽 궁궐의 높은 담장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조선전기, 궁궐 정문
경복궁 광화문 (景福宮 光化門)은 조선 왕실과 국가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문으로, 석축기단(石築基壇)에 3궐(三闕)의 홍예(虹霓)를 만들고 그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형식의 중층집으로 우진각지붕을 얹었다.
1395년(태조 4) 경복궁을 창건할 때 정전(正殿)인 근정전과 편전(便殿)인 사정전·침전인 경성전(慶成殿)·연생전(延生殿)·강녕전(康寧殿) 등을 지어 궁궐의 기본구조를 갖춘 후, 1398년에 그 둘레에 궁성을 쌓은 뒤 동·서·남쪽에 성문을 세우고, 동문을 건춘문(建春門), 서문을 영추문(迎秋門), 북문을 신무문(神武門), 남문을 광화문이라 이름 지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나무, 불, 쇠, 물 등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전통적인 오행설에 유래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탄 것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당시인 1865년(고종 2)에 다시 짓게 했다. 1927년에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인해 경복궁의 여러 곳이 헐리고 총독부청사가 들어서면서 건춘문 북쪽으로 옮겨졌다.
이후 광화문은 6·25사변 때 폭격을 맞아 편전인 만춘전(萬春殿)과 함께 불타버렸다. 1968년에 석축 일부가 수리되고 문루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중건되어, 위치도 원위치에서 뒤로 물러서 있었는데, 2006년 경복궁 복원공사로 철거·해체되었다가 이후 광화문 이전 공사가 개시 되어 원래 위치에 제 모습으로 2010년 8월 완공되었다. 담장의 동남쪽과 서남쪽 모퉁이에 동십자각(東十字閣)과 서십자각(西十字閣)을 세워 망루로 사용했는데 서십자각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됐고, 동십자각은 도로 확장으로 인해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쌓으면서 길 한가운데에 있게 되었다.
광화문은 석축기단의 세 곳에 홍예문(虹霓門)을 내어 3문형식을 취하였는데, 가운데 칸은 높이 17척 5촌, 너비 18척이고, 양 옆칸은 높이 16척, 너비 14척 5촌씩이다. 포작(包作)은 안 7포, 밖 5포로 출목수로는 안 3출목, 밖 2출목인 다포식을 채택하였다.
1층 기둥높이는 7척이고, 기둥 간격은 앞면은 가운데가 27척, 양옆이 25척씩이고, 옆면은 10척씩이다. 1층의 기둥 사이는 개방하였고, 2층에는 판문을 달아 열고 닫게 하였다. 내부살미는 조선 말기에 흔히 쓰던 운궁(雲宮: 살미 내부의 중첩된 부분)을 사용하였고, 내목도리(內目道里) 아래에 장화반(長花盤: 창방과 장여 사이에 길게 놓인 화반)을 놓았으며 공포 사이에는 포벽을 마련하였다. 가구수법은 아래층 대들보가 고주(高柱)에서 합보 형식을 하고 대들보와 위층 마루 사이에 공간을 두었다. 아래위층 처마는 모두 겹처마이고 지붕의 각 마루에는 취두·용두·잡상들을 배치하였다.
‘궐’의 형태는 높다란 석대 위에 2층 누각을 세운 것이 일반적이었음에 비추어, 조선시대 궁궐의 정문 가운데 유일하게 ‘궐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 조선시대의 정궁(正宮)의 ‘정문’(正門)으로서 의의가 있고, 2010년 8월 완공된 광화문은 원래 위치와 모습을 되찾았으며,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된 광화문은 조선 말기의 궁궐건축을 대표하는 뛰어난 건물로서 위상을 지닌다.

▲경복궁 광화문, 남쪽의 궁궐 정문 앞 해태상

▲경복궁 광화문, 남쪽의 궁궐 정문 앞 해태상

▲경복궁 광화문, 남쪽의 궁궐 정문 앞 해태상

▲경복궁 광화문, 남쪽의 궁궐 정문 앞 해태상
경복궁 광화문 앞에 위치한 해태이다. 원래 해태는 지금처럼 광화문 좌우가 아닌 사헌부 앞에 위치하고 있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있으며 코는 둥글고 큼직한 편이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앞발을 딛고 뒷발로 앉은 모습이며 갈퀴를 더하여 나타내었다. 몸에는 둥근 형태의 비늘을 표현하였다.

▲경복궁 광화문, 남쪽의 궁궐 정문

▲경복궁 서수문장청

▲경복궁 서수문장청

▲경복궁 동수문장청

▲경복궁 동수문장청
수문장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4품 이상의 무관 중 병조의 추천과 국왕의 임명을 거쳐서 임명되는 관직으로 도성과 궁궐, 종묘(宗廟)문의 관리와 궁궐 입직 근무를 수행하였다. 처음에는 수문장의 병조의 관청에서 숙직(宿直)이나 근무를 보았다. 성종 이후에는 궁궐문 안쪽에 직소를 두고 수문장과 입직하는 군사들이 머물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에도 수문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주의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선원전(璿源殿) 등 왕실 사당에 수문장 각 1명씩 배치됐다.
수문장 교대의식도 ‘입직을 서는 군사들이 3일마다 교대’를 하는 ‘경국대전’의 규정을 근거로 재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문장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무기인 환도(環刀)를 허리에 패용(佩用)하고 있으며, 지휘봉인 등채와 수문장의 신분증인 둥근 모양의 수문장패(守門將牌)를 항상 지닌다.
특히 수문장패는 수문장이 근무할 때 지니는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수문장 제도상 국왕의 임명을 받고 지급된 신분증이기 때문에 수문장교대 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수문장패와 암호를 통해 서로의 신분과 지위를 먼저 확인한 후 수문장 교대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 수문장은 수문장 교대의식 외 근무를 마치고 수문군 대기소인 영군직소를 돌아온 수문군들의 훈련 감독, 광화문 근무시 군사들의 태도나 장비를 검사하는 적간(摘奸)을 담당하고 있다.

▲경복궁 영군직소

▲경복궁 영군직소

▲경복궁 용성문

▲경복궁 용성문

▲경복궁 협생문
 [박정기의 공연산책 364] 극단 이구아구,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
예술공간 혜화에서 극단 이구아구의 안톤 체홉 작 여무영 각색 번역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을 관람했다.안똔 체홉(Анто́н Че́хов, Anton Chekhov,1860~1904)은 러시아의 의사, 소설가, 극작가이다. 1867년 고향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예비학교를 다닌 후, 1869년 고전 교육을 목표로 하는 타간로크 인문학교에 입학한다.1879년 8년 ...
[박정기의 공연산책 364] 극단 이구아구,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
예술공간 혜화에서 극단 이구아구의 안톤 체홉 작 여무영 각색 번역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을 관람했다.안똔 체홉(Анто́н Че́хов, Anton Chekhov,1860~1904)은 러시아의 의사, 소설가, 극작가이다. 1867년 고향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예비학교를 다닌 후, 1869년 고전 교육을 목표로 하는 타간로크 인문학교에 입학한다.1879년 8년 ...

 김명주 경제부지사, 동부권 창업거점 운영현황 현장 점검
김명주 경제부지사, 동부권 창업거점 운영현황 현장 점검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시설경영자과정 특강 개최
사이버대학 서울디지털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시설경영자과정 특강 개최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르세라핌, 2곡 동시에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 획득
르세라핌, 2곡 동시에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 획득
 황선홍, 대전 사령탑으로 4년 만의 복귀
황선홍, 대전 사령탑으로 4년 만의 복귀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