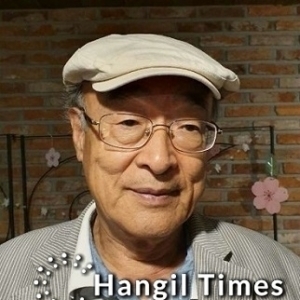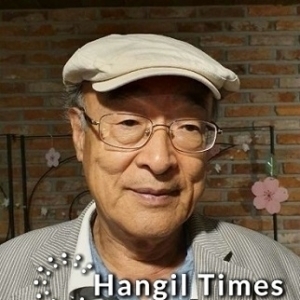[박광준 기자] 장악원(掌樂院) 터는 조선시대 궁중과 국가 행사에서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한 관청인 장악원이 있던 자리이다. 장악원은 1897년 교방사(敎坊司)로 개칭될 때까지 427년 동안 공식적으로 존재한 국립음악기관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로 바뀌었다가 광복 후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이 설립되면서 지금에 이른다.

장악원(掌樂院)은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조선시대의 국립음악기관이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 및 왕실 행사에서 행해지는 무용 및 연주활동은 전악서(典樂署), 아악서(雅樂署), 관습도감(慣習都監), 악학(樂學) 등의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관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1457년(세조 3)에 전악서와 아악서가 장악서(掌樂署)로, 악학과 관습도감이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각각 통합됐다. 이후 1466년(세조 12)에 악학도감의 일부를 장악서가 흡수하면서 궁중의 음악과 무용, 연주를 담당하는 기관이 장악서로 통합됐다. 1470년(성종 1)에는 장악서의 명칭이 장악원(掌樂院)으로 바뀌었다. 장악원 터는 조선시대 장악원이 있던 곳으로,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외환은행 본점 일대에 해당한다.

장악원의 모든 음악행정은 문관 출신의 관원이 관장했고, 음악교육 및 춤 연주에 관한 일은 전악(典樂) 이하 체아직(遞兒職, 조선시대 교대로 근무하며 녹봉을 받던 관직)이었던 녹관(祿官)들이 수행했다. 그리고 장악원에서 실제로 음악을 연주하고 무용을 공연한 것은 장악원 소속의 악공(樂工), 악생(樂生), 관현맹(管絃盲), 여악(女樂), 무동(舞童)들이었다.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 이후 장악원은 궁내부의 장례원(掌隷院)에 소속됐다가 1897년(고종 34) 교방사(敎坊司)로 명칭이 바뀌었다. 을사늑약 이후인 1907년에는 장악과(掌樂課)로 축소 개편됐고, 국권피탈 이후에 아악대(雅樂隊)로 개편되어 명맥을 이어갔다. 이후 191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이왕직아악부(李王職雅樂部)로 다시 축소 개편됐고 인원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광복 직후에는 구왕궁아악부(舊王宮雅樂部)로 개칭됐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인 1950년 1월 18일 국립국악원(國立國樂院)이 설립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구 을지로 66 외환은행 본점 앞 화단에 1986년에 설치된 장악원 터 표지석이 있다./사진-박광준 기자
 수원시립미술관, 농아인 초청 '기획전 수어해설 전시 투어' 운영...“누구나 즐기는 미술관”
[이승준 기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이달 29일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수원시지부 농아인 20명을 초청해 '기획전 수어해설 전시투어'를 진행했다.'기획전 수어해설 전시투어'는 기존의 미술관 현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인 도슨트 또는 오디오가이드가 농아인들이 이용하기엔 어...
수원시립미술관, 농아인 초청 '기획전 수어해설 전시 투어' 운영...“누구나 즐기는 미술관”
[이승준 기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이달 29일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수원시지부 농아인 20명을 초청해 '기획전 수어해설 전시투어'를 진행했다.'기획전 수어해설 전시투어'는 기존의 미술관 현장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해설 프로그램인 도슨트 또는 오디오가이드가 농아인들이 이용하기엔 어...

 월 40㎞ 자전거 타면 5000원 쏜다!
월 40㎞ 자전거 타면 5000원 쏜다!
 충남도립대, 일본 구마모토현립 기술단기대학 MOU
충남도립대, 일본 구마모토현립 기술단기대학 MOU
 넥센타이어,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열어...안전의식 고취
넥센타이어,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열어...안전의식 고취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걸그룹 아이몬드, 이달 31일 쇼케이스 6월 3일 데뷔
걸그룹 아이몬드, 이달 31일 쇼케이스 6월 3일 데뷔
 대한체육회, 파리바게뜨와 공식 후원 계약
대한체육회, 파리바게뜨와 공식 후원 계약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