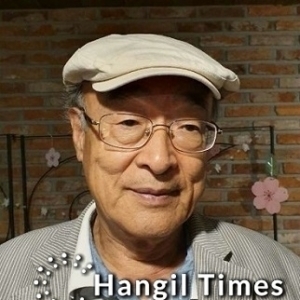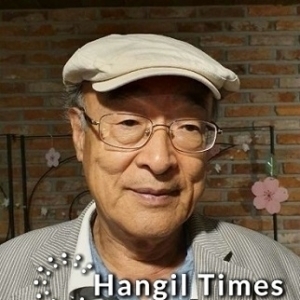[박광준 기자] #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유형문화재 제74호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사진-문화재청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사진-문화재청
순흥안씨 묘군은 조선 초기 개국공신인 양도공(良度公) 안경공(安景恭)과 아들.손자에 이르는 3대에 걸친 묘역이다. 1990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74호로 지정됐고, 2017년 2월 9일 문화재 및 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묘역은 크게 오른쪽 2기와 왼쪽 3기로 구분된다. 오른쪽에는 안경공과 문숙공(文肅公) 안숭선(安崇善)의 묘가 위 아래로 자리잡고 있고, 왼쪽에는 소윤공 안숭신(安崇信), 정숙공(靖肅公) 안순(安純), 안천공(安川公) 안숭효(安崇孝)의 묘가 위에서 아래로 위치한다. 이들 묘주인의 관계는 안순이 안경공의 아들이면서, 안숭선.안숭신.안숭효의 아버지이다.
안경공은 자가 손보(遜甫), 시호는 양도(良度)이고, 아버지는 조선 건국에 참여해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에 오른 안종원(安宗源)이다. 공민왕 14년(1365) 국자감시(國子監試)에 합격하고, 우왕 2년(1376) 문과에 급제했고, 1382년에는 경상도안렴사(慶尙道按廉使)로 있으면서 합주(陜州)에서 사노(私奴)들이 일으킨 난을 진압했다.
공양왕 2년(1390) 정몽주(鄭夢周)를 탄핵했다가 오히려 좌천됐다. 이듬해에 예문관제학에 보임되고, 1392년 좌부대언(左副代言)을 거쳐 좌대언에 올라 조선 건국에 참여했다. 곧 도승지에 제수되고 개국공신이 책봉될 때 3등공신이 됐다. 태조 2년(1393) 전라도관찰출척사(全羅道觀察黜陟使)로 나아갔고, 이듬해에 흥녕군(興寧君)에 봉해졌다.
태종 6년(1406) 판공안부사(判恭安府事)에 이어 곧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에 임명됐고, 1410년에는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가 됐다. 1416년 보국숭록대부 집현전대제학(輔國崇祿大夫集賢殿大提學)에 제수되고 흥녕부원군(興寧府院君)이 됐다.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사진-문화재청안순은 자가 현지(顯之), 시호는 정숙(靖肅)이고, 성품이 강직했다. 1389년 문과에 급제하고, 공양왕 2년(1390) 성균학유가 됐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사재주부(司宰注簿)로 발탁됐다. 그 후 세종 원년(1419) 호조참판으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공조판서로 승진했다.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사진-문화재청안순은 자가 현지(顯之), 시호는 정숙(靖肅)이고, 성품이 강직했다. 1389년 문과에 급제하고, 공양왕 2년(1390) 성균학유가 됐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사재주부(司宰注簿)로 발탁됐다. 그 후 세종 원년(1419) 호조참판으로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이듬해 공조판서로 승진했다.
1424년 호조판서가 됐고, 1432년에 판중추원사 겸판호조사(判中樞院事兼判戶曹事), 1435년에 의정부찬성사를 역임하고, 1437년에는 충청도 지방의 기근을 수습하기 위한 도순문진휼사(都巡問賑恤使)로 그 임무를 잘 수습한 공로로 숭정대부에 올랐다. 그는 오랫동안 호조판서 또는 판호조사를 겸하면서 국가의 전곡(錢穀)을 관장했는데, 경비출납이 정확했다는 사실과 같이 특히 국가의 재정을 책임맡은 직책에서 큰 공로를 쌓았다. 저술로는 증조부 안축(安軸)의 문집인 ‘근재집(謹齋集)’의 부록에 유고가 실려 있다.
안숭선의 자는 중지(仲止), 호는 옹재(雍齋)이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태종 11년(1411) 생원시에 합격하고, 세종 2년(1420)에 다시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지평으로 승진했고, 그 이듬해에 이조전랑이 됐다. 1429년에 대호군으로 승진해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왔고, 1437년 대사헌이 됐다. 1443년에 형조판서, 1444년에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지중추원사.집현전대제학, 1445년에 병조판서겸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 수찬에 참여했고, 1448년에는 병조판서로서 예문관대제학을 겸했다. 문종 즉위년(1450)에 의정부 우참찬을 거쳐 좌참찬에 이르렀고, ‘근재집’ 부록에 유고가 전한다.
안숭효는 자가 계충(季忠), 호는 한백당(寒栢堂)이다. 일찍이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음보로 벼슬길에 나아가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호조참의를 지내고, 단종 2년(1454) 경기관찰사가 됐다. 이어서 덕녕부윤(德寧府尹)을 역임하면서 세조의 집권에 협조해 좌익원종공신(佐翼原從功臣) 2등에 책록됐다. 그 뒤 대사헌과 공조참판.호조참판.중추원부사를 지냈다.
충청도 지역에 재변이 심각해 재덕을 겸비한 인물이 요청되자 이에 선발돼 세조 5년(1459) 동지중추원사겸충청도관찰사에 임명돼 탐관오리를 숙청하고, 유망민에 대한 진휼사업을 효과적으로 폈으나, 이듬해 과로로 임지에서 죽었다.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사진-문화재청묘역에는 무덤 이외에, 신도비(神道碑) 3기, 묘비 3기, 문.무인석 8기, 장명등 2기 등이 있다. 안경공의 묘비는 높이 225cm, 폭 56cm로 윤유(尹惟)가 지었고, 안순의 묘비는 높이 226cm, 폭 95. 6cm로 변계량(卞季良)의 글이고, 안숭선의 비는 높이 244cm, 폭 88cm로 성삼문(成三問)의 글이다.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사진-문화재청묘역에는 무덤 이외에, 신도비(神道碑) 3기, 묘비 3기, 문.무인석 8기, 장명등 2기 등이 있다. 안경공의 묘비는 높이 225cm, 폭 56cm로 윤유(尹惟)가 지었고, 안순의 묘비는 높이 226cm, 폭 95. 6cm로 변계량(卞季良)의 글이고, 안숭선의 비는 높이 244cm, 폭 88cm로 성삼문(成三問)의 글이다.
순흥안씨 묘군은 무덤들이 원형대로 잘 보존돼 있어서 조선 전기 분묘의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묘 앞에 세워진 비석과 각종 석물 등을 통해 묘제 변천사를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문화재 확대 지정사유에 대해 안숭신(安崇信)은 개국공신인 양도(良度) 경공(景恭)의 아들 순(純)의 사남 가운데 삼남으로 1395년 금천 시흥에서 나시고 1441년 졸(卒)하셨다. 오위도총부 사직(五衛都摠府司直)과 경기도 찰방(京畿道 察訪)을 거쳐 인수부 소윤(仁壽府 少尹)에 올랐다. 배우자는 목사(牧使) 숙야(叔野)의 따님 영인 한산이씨(令人 韓山李氏)로서 현재 금천구 시흥동 해당 묘역에 합폄(合窆)되어 있다.
안숭선(安崇孝)는 경공(景恭)의 아들 순(純)의 사남으로 나시어 자는 계충(季忠)이며 1454년 경기도관찰사와 이후 대사헌, 공조참판, 호조참판에 제수되었다. 문헌상 생년은 미상이며 1460년에 졸하였다. 배우자 정부인 한산이씨(貞夫人 韓山李氏)는 판서(判書) 숙무(叔畝)의 따님으로 해당 묘역에 합장되어 있다.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의 숭효·숭신의 묘는 15세기에 조성된 예장묘소로서 당대의 묘제와 석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가 충분하므로, 기지정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74호 순흥안씨양도공파 묘역에 포함하여확대 지정하고 보존하고자 한다.
# 정정공 강사상 묘역
유형문화재 제104호
정정공 강사상 묘역(貞靖公 姜士尙 墓域)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동에 있는, 조선 중기 16세기의 문신 강사상(姜士尙, 1519∼1581)의 묘역이다. 1997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의 유형문화재 제104호로 지정됐다.
조선 중기 16세기의 문신 강사상(姜士尙, 1519∼1581)의 신도비이다. 강사상은 본관이 진주(晉州), 자는 상지(尙之), 호는 월포(月浦)이다. 의정부 사인(舍人) 강온(姜溫)과 진사 박식(朴栻)의 따님 사이에서 1519년 6월 2일 출생했다.
1543년 진사가 됐고 1546년 식년문과에 급제해 예문관 검열을 시작으로 1552년 수찬.정언.헌납.검상(檢詳).사인(舍人).직제학 등을 지냈다. 1557년 동부승지, 1558년 우승지를 거쳐 홍문관 부제학이 됐고, 1559년 좌승지가 됐고 이듬해 도승지를 거쳐 예조참의가 됐다. 명종16년(1561년) 왕의 특명으로 형조참판이 됐고 그 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정정공 강사상 묘역/시진-문화재청그 뒤 대사헌을 거쳐 다시 부제학으로 있을 때 권신이던 이량(李樑)의 불법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부호군(副護軍)으로 좌천됐고 1564년 도승지로 다시 기용됐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가 돼 정여창(鄭汝昌)을 배향하는 함양의 남계서원(藍溪書院)에 사액(賜額)을 청해 허락을 받았다.
정정공 강사상 묘역/시진-문화재청그 뒤 대사헌을 거쳐 다시 부제학으로 있을 때 권신이던 이량(李樑)의 불법을 탄핵하다가 도리어 부호군(副護軍)으로 좌천됐고 1564년 도승지로 다시 기용됐다. 이듬해 경상도관찰사가 돼 정여창(鄭汝昌)을 배향하는 함양의 남계서원(藍溪書院)에 사액(賜額)을 청해 허락을 받았다.
1566년 예조참판과 대사헌을 지냈고 선조1년(1568년) 대사헌으로서 사간 유희춘(柳希春)과 함께 조광조(趙光祖)의 신원(伸寃)과 추숭(追崇)을 건의했고, 1570년 주청사(奏請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병조.형조·이조판서를 거쳐 한성부 판윤(判尹)을 지냈고, 1576년 우참찬을 거쳐 선조 11년(1578) 우의정으로 승진돼 2년 뒤 영중추부사로 옮겨졌다. 사망 후 1604년 아들 강인(姜絪)이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책록되면서 영의정에 추증됐다. 부인은 파평윤씨 훈련원 부정 윤광운(尹光雲)의 따님으로 슬하에 서(緖).신(紳).인(絪).담(紞)의 4형제와 2녀를 두었다.
비는 네모난 대좌(臺座) 위에 비신(碑身)을 얹고 그 위에 기왓골을 새긴 팔작지붕 모양의 개석(蓋石)을 얹었다. 대좌 윗면에는 연꽃잎 무늬를 새기고 옆면에 안상(眼象)을 얕게 새겼다. 비문은 예조판서 권유(權愈, 1633∼1704)가 지었고, 글씨는 홍문관 교리 이진검(李眞儉, 1672∼1717)이 썼고, ‘右議政贈諡貞靖姜公神道碑’라 새긴 머리전서[頭篆]는 사헌부 대사헌 권규(權珪, 1648∼1723)가 썼다.
이진검의 글씨는 한호(韓濩)의 서풍을 따랐고, 권규의 머리전서 글씨는 허목(許穆)의 고전(古篆) 서풍을 따랐다. 비의 건립연대는 비문 말미에 ‘崇禎紀元後(숭정기원후)…’ 다음 부분이 확인되지 않지만 비문을 짓고 쓴 사람들의 관직으로 보아 대략 18세기초로 여겨진다.
황제성 작가, 어린왕자의 동심을 화폭에 담은 'nomad-idea' 개인전 [이승준 기자] 화면 가득 채운 소설 어린왕자의 주요 소재들이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몽환적인 풍경속의 피노키오, 비행기 위에서 무심하듯 하늘을 바라보는 어린왕자의 모습은 잃어버린 순수의 세계를 되찾아 주려는 듯 동화의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자신...

 충남도민 '공익나눔장터 공공마켓’ 연다
충남도민 '공익나눔장터 공공마켓’ 연다
 두산로보틱스, 인천국제공항과 디지털 전환 협업체계 구축 MOU 체결
두산로보틱스, 인천국제공항과 디지털 전환 협업체계 구축 MOU 체결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세종대, 대한민국 육군과 사이버 전문인력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세종대, 대한민국 육군과 사이버 전문인력 분야 상호협력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천시 가족센터 최유리 학생, ‘제15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이중언어 부문 장려상 수상
이천시 가족센터 최유리 학생, ‘제15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이중언어 부문 장려상 수상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에스파 첫 정규 ‘Armageddon’, 아이튠즈 美 포함 25개 지역 1위+월드와이드 차트 1위
에스파 첫 정규 ‘Armageddon’, 아이튠즈 美 포함 25개 지역 1위+월드와이드 차트 1위
 아반떼 N2 마스터즈 2라운드 전대은 우승
아반떼 N2 마스터즈 2라운드 전대은 우승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