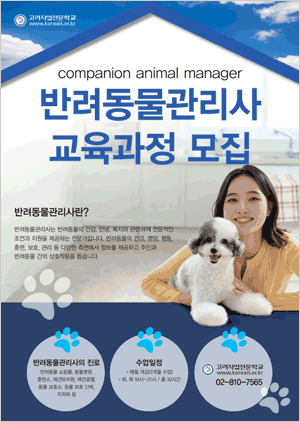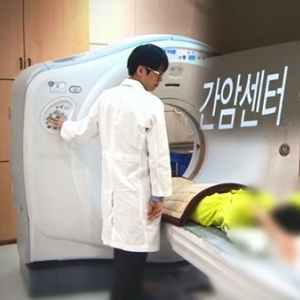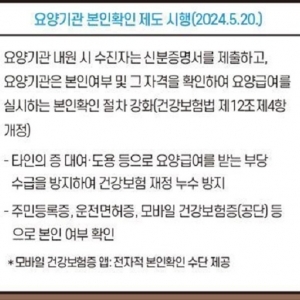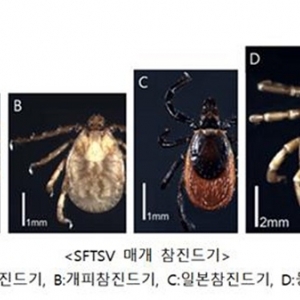[박광준 기자] 부마민주항쟁 과정에서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봤다면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 씨는 1979년 10월19일 "중앙정보부가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넘겨진 A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형사보상금 4천676만 원을 받았다.
그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861만 원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2021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국가가 A 씨에게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관련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급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마항쟁보상법과 유사한 구조를 띤 민주화보상법이 2018년 8월 위헌 결정을 받은 점도 근거가 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다.
정부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비춰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유신독재에 항거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항쟁이다.
광주민주화운동과 4·19 혁명,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표적 민주항쟁에 속한다.
황제성 작가, 어린왕자의 동심을 화폭에 담은 'nomad-idea' 개인전 [이승준 기자] 화면 가득 채운 소설 어린왕자의 주요 소재들이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몽환적인 풍경속의 피노키오, 비행기 위에서 무심하듯 하늘을 바라보는 어린왕자의 모습은 잃어버린 순수의 세계를 되찾아 주려는 듯 동화의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자신...

 충남도민 '공익나눔장터 공공마켓’ 연다
충남도민 '공익나눔장터 공공마켓’ 연다
 헌재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
헌재 “실질적 혼인기간만 연금 분할, 법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
 두산로보틱스, 인천국제공항과 디지털 전환 협업체계 구축 MOU 체결
두산로보틱스, 인천국제공항과 디지털 전환 협업체계 구축 MOU 체결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이천시 가족센터 최유리 학생, ‘제15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이중언어 부문 장려상 수상
이천시 가족센터 최유리 학생, ‘제15회 경기도 다문화가족 말하기 대회’ 이중언어 부문 장려상 수상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에스파 첫 정규 ‘Armageddon’, 아이튠즈 美 포함 25개 지역 1위+월드와이드 차트 1위
에스파 첫 정규 ‘Armageddon’, 아이튠즈 美 포함 25개 지역 1위+월드와이드 차트 1위
 아반떼 N2 마스터즈 2라운드 전대은 우승
아반떼 N2 마스터즈 2라운드 전대은 우승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