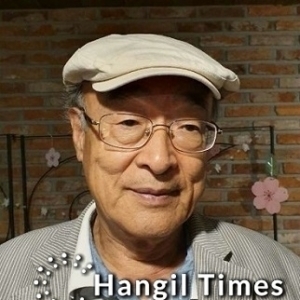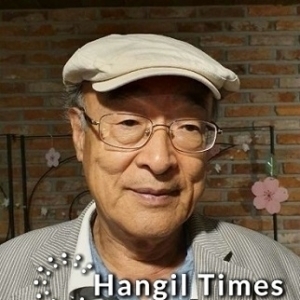[박광준 기자] # 분청사기 상감 연꽃 넝클무늬 병
 분청사기 상감 연꽃 넝클무늬 병/사진-박광준 기자상감 연꽃 넝쿨무늬 병의 입구 부분은 나팔처럼 벌어져 있고, 좁은 목을 지나 점점 벌어지다가 몸통 아랫부분에서 한껏 풍만해지고 다시 좁아져 높고 튼튼한 굽으로 이르는 안정감이 돋보이는 병이다. 병의 형태와 문양의 구성이 잘 조화되어 짜임새 있고,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장식에서 단정함이 느껴진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병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수작(秀作)으로 평가된다.
분청사기 상감 연꽃 넝클무늬 병/사진-박광준 기자상감 연꽃 넝쿨무늬 병의 입구 부분은 나팔처럼 벌어져 있고, 좁은 목을 지나 점점 벌어지다가 몸통 아랫부분에서 한껏 풍만해지고 다시 좁아져 높고 튼튼한 굽으로 이르는 안정감이 돋보이는 병이다. 병의 형태와 문양의 구성이 잘 조화되어 짜임새 있고, 정성스럽게 새겨 넣은 장식에서 단정함이 느껴진다. 조선 초기에 제작된 병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수작(秀作)으로 평가된다.

문양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문양으로 몸통 중앙 부분 세 곳에 연꽃을 배치했고, 각 연꽃은 줄기가 원을 그리듯이 연결됐다. 연꽃과 연잎의 내부를 흑상감해 강조한 점이 돋보인다. 연꽃 문양 외의 여백은 백상감 기법으로 점을 찍어 채웠다. 보조 문양으로는 목 윗부분부터 넝쿨, 연꽃잎, 잎이 여덟 개인 변형 연꽃잎을 넣었고, 굽 주위에는 연꽃잎 무늬를 넣었다. 유약이 잘 녹아 맑은 광택이 나며 고르고 잘게 금이 간 빙렬이 있다. 굽은 다리 굽으로 접지면의 유약을 닦아내고 내화토를 얇게 발라서 구워냈다./사진-박광준 기자
# 나전 칠 경전상사/고려 후기
 나전 칠 경전상사, 고려 후기/사진-박광준 기자
나전 칠 경전상사, 고려 후기/사진-박광준 기자
대장경 등의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상자이다. 나무로 형태를 만들어 옻칠한 후 표면을 자개와 금속으로 장식했다. 모서리를 살짝 깎은 형태의 뚜껑과 빼곡한 무늬. 금속으로 민든 경첩과 양 옆의 손잡이 등 고려시대 경함의 특징을 벌 보여준다. 나전을 얇게 간 뒤 작은 조각으로 잘라 섬세하고도 자유자재로 구성한 무늬에서 고려 장인의 뒤어난 솜씨가 느껴진다./사진-박광준 기자
#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 책봉 옥책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 책봉 옥책/사진-박광준 기자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 책봉 옥책/사진-박광준 기자
1908년에 순종이 철종의 비 철인왕후(哲仁王后 ; 1837-1878)의 존호(尊號)를 ‘장황후(章皇后)’로 올리면서 내린 옥책(玉冊)이다. 옥책은 국왕이 선왕.선왕비.왕비 등에게 존호를 올리거나 왕비를 책봉할 때 덕을 기리는 송덕문(頌德文)을 옥에 새긴 것을 말한다.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 책봉 옥책 일부/사진-박광준 기자
철종비 철인왕후 왕비 책봉 옥책 일부/사진-박광준 기자
철인왕후는 안동김씨 김문근(金汶根)의 딸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그녀가 왕비로 책봉된 후 절정에 달했다./사진-박광준 기자
# 재조본 경률이상 권8
1993년 4월 27일 보물로 지정됐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1권 1첩, 목판본이다.
'경률이상'의 제8권으로, 판수제(版首題)에 의하면 선수일(仙守日) 등 13명의 각수(刻手)가 동원됐음을 알 수 있다. 각 장은 각수의 글씨새김 솜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재조본 경률이상 권8/사진-박광준 기자
재조본 경률이상 권8/사진-박광준 기자
이 불교경전은 '경률이상' 전체 50권 가운데 제8권 자행보살부(自行菩薩部)의 ‘살타파륜위욕문법매심혈수일(薩陀波崙爲欲聞法賣心血髓一)’부터 ‘유년위귀소미(幼年爲鬼所迷)’까지를 수록한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을 제본한 책이다.
 재조본 경률이상 권8/문화재청경(經)과 율(律)에서 요점을 각 주제별로 뽑아 그 출전을 표시해 학습하는 데 편리하게 엮은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고려시대인 1243년(고종 30)에 남해(南海)의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목판을 새겼는데, 새긴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인쇄상태, 지질(紙質), 표지(表紙)의 꾸밈 등으로 보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사진-박광준 기자
재조본 경률이상 권8/문화재청경(經)과 율(律)에서 요점을 각 주제별로 뽑아 그 출전을 표시해 학습하는 데 편리하게 엮은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고려시대인 1243년(고종 30)에 남해(南海)의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목판을 새겼는데, 새긴 사람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인쇄상태, 지질(紙質), 표지(表紙)의 꾸밈 등으로 보아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사진-박광준 기자
#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는 고려 현종(1011∼1031) 때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한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의 하나이다. 유가행파(瑜伽行派)의 기본 경전 중 하나로, 유가사지는 유가행의 수행 과정을 일컫는다. 한역본(漢譯本)에서는 미륵(彌勒)이 저술했다고 했지만, 티베트본에는 무착(無着)이 지었다고 전한다. 당나라 현장(玄奘, 602∼664)이 646∼648년에 100권으로 한역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사진-박광준 기자이 책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15에 해당하는 1권 1책이다. 쪽물을 들인 종이인 감지(紺紙) 표지에 아교에 금가루를 갠 금니(金泥)로 책이름과 권차(卷次), 천자문으로 함의 순서를 적은 함차(函次)인 ‘습(習)’자를 써놓았다. 전체 56장으로 각 장은 세로 28.6㎝, 가로 47.6㎝ 크기이고, 본문은 23행 14자이다. 장수(張數) 표시는 해인사 대장경의 ‘장(張)’과 달리 ‘장(丈)’으로 되어 있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사진-박광준 기자이 책은 대장도감(大藏都監)에서 간행한 '유가사지론' 100권 중 권15에 해당하는 1권 1책이다. 쪽물을 들인 종이인 감지(紺紙) 표지에 아교에 금가루를 갠 금니(金泥)로 책이름과 권차(卷次), 천자문으로 함의 순서를 적은 함차(函次)인 ‘습(習)’자를 써놓았다. 전체 56장으로 각 장은 세로 28.6㎝, 가로 47.6㎝ 크기이고, 본문은 23행 14자이다. 장수(張數) 표시는 해인사 대장경의 ‘장(張)’과 달리 ‘장(丈)’으로 되어 있다.
제작한 뒤에 축축한 기운이 스며 들어 책 이름과 권차의 일부, 본문의 약 20여 자 정도가 훼손됐지만, 보존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종이 재질이나 인쇄 상태로 보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가사지론'권32(국보, 1992년 지정)와 함께 11세기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사진-문화재청송성문씨가 소장했다가, 2003년에 '대보적경(大寶積經)'권59 (국보, 1988년 지정), 초조본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권12(국보, 1992년 지정), 초조본 '유가사지론'권32(국보, 1992년 지정) 등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오늘에 이른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사진-문화재청송성문씨가 소장했다가, 2003년에 '대보적경(大寶積經)'권59 (국보, 1988년 지정), 초조본 '현양성교론(顯揚聖敎論)'권12(국보, 1992년 지정), 초조본 '유가사지론'권32(국보, 1992년 지정) 등과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해 오늘에 이른다.
'유가사지론'전 100권은 본지분, 섭결택분, 섭석분, 섭이문분, 섭사분 등 5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은 다시 여러 품으로 나누어져 있다.
권15는 제1분인 본지분(本地分) 17지(地) 중에서 10번째 문소성지(聞所成地)인 권13∼15에 해당한다. 본지분은 불교 유심론의 윤회 및 열반에 관한 교리에 기초해 이뤄진 것이어서, 분량이나 내용으로 볼 때 '유가사지론'의 중심 부분이다. 또한 17지를 ‘유가사지(瑜伽師地)’라고 일컫는 것처럼, 유가사들이 17지를 수행지로 삼았기에 17설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사진-문화재청648년에 당 태종이 현장에게 '유가사지론'을 묻자 현장이 ‘17지를 밝혀놓은 책이다’고 답하면서 17지의 조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때문에 이 책을 ‘십칠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15/사진-문화재청648년에 당 태종이 현장에게 '유가사지론'을 묻자 현장이 ‘17지를 밝혀놓은 책이다’고 답하면서 17지의 조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때문에 이 책을 ‘십칠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소성지는 수양을 통한 불도(佛道)에 밝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술, 논쟁, 농업과 상업, 산술, 계량, 관상, 주문, 길쌈, 건축, 음악 등 온갖 기술과 재주에도 밝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초조대장경은 고려 사람들이 국내에 전하는 것 외에 송나라 대장경을 바탕으로 삼은 경우에도 체재는 따르지만 번각(飜刻)하지 않고 다시 써서 정각했기에, 조판술의 우수성을 돋보이게 했다. 또한 거란 대장경의 경우는 판하본(板下本)을 새로 마련해 새겨 고려의 독자성을 지켰다. 초조대장경은 고려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사진-박광준 기자, 문화재청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24년 '나눔미술은행' 개최
[이승준 기자]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김성희)은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 대여.전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2024년 '나눔미술은행' ‘소장품 대여.전시 지원형’을 이달 4일부터 개최한다.'나눔미술은행'은 전국 곳곳에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으로 대여.전시하는 예...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2024년 '나눔미술은행' 개최
[이승준 기자]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김성희)은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 대여.전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2024년 '나눔미술은행' ‘소장품 대여.전시 지원형’을 이달 4일부터 개최한다.'나눔미술은행'은 전국 곳곳에서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을 무상으로 대여.전시하는 예...

 세계 각국에 충남 방문의 해 알린다
세계 각국에 충남 방문의 해 알린다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에 5억 6천만 원 장학금 지원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에 5억 6천만 원 장학금 지원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공무원연금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무원연금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에스파 ‘Supernova’, 써클차트 4관왕+빌보드 글로벌.글로벌 200 자체 최고 순위
에스파 ‘Supernova’, 써클차트 4관왕+빌보드 글로벌.글로벌 200 자체 최고 순위
 넥센타이어, ‘2024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SINCE 2006)’ 2라운드 개최
넥센타이어, ‘2024 넥센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SINCE 2006)’ 2라운드 개최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