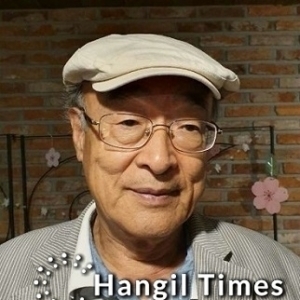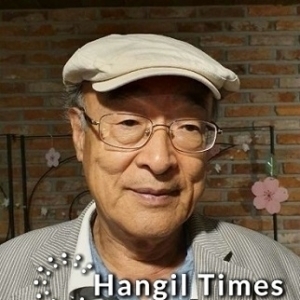갑사는 백제 구이신왕 원년(420)에 아도화상이 처음 지었고, 통일신라 문무왕 19년(679)에 의상이 고쳐 지었다고 한다. 그 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고치고 넓혀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범종루, 갑사사적비(충남 유형문화제), 월인석보목판(보물), 관음전, 석조약사여래입상(충남 유형문화제), 표충원(충남 문화재자료), 대적선원, 요사채 등이 자리했다.






▲ 범종루
이곳에 비치된 범종, 북, 운판, 목어는 모두 부처님에게 예배드릴 때 사용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예불과 사시공양(巳時供養), 저녁예불 때에 사용한다.
이들은 소리로써 불음(佛音)을 전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범종은 지옥의 중생을 향하여 불음을 전파하고, 홍고는 북으로 축생의 무리를 향하여, 구름 모양의 운판은 허공을 나는 생명을 향하여, 나무로 만든 물고기 형상의 목어는 수중의 어류를 향하여 소리를 내보낸다는 상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갑사 사적비(충청남도 유형문화제 제52호)
비신의 너비 133㎝, 두께 49㎝, 높이는 225㎝. 1976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갑사의 내력을 적어놓은 사적비로 ‘崇禎十七年甲申後十六年己亥九月日立(숭정17년갑신후16년기해9월일입)’이라는 기록이 있어 1659년(효종 10)에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화강석 자연 암반으로 좌대를 삼고, 암반 가운데에 비신을 끼울 수 있도록 방형 홈을 파내어 비를 세웠다. 비신의 재료는 대리석인데, 위에는 지붕돌을 올리고 장방형 모임지붕 모습이다.
비신에는 전행무장현감(前行茂長縣監) 홍석구(洪錫龜)가 전서체로 쓴 ‘公州鷄龍山岬寺事蹟碑銘(공주계룡산갑사사적비명)’이 있고, 문장은 비신의 4면에 새겼는데, 이 비문은 여주목사 이지천(李志賤)이 짓고, 전 공주목사 이기징(李箕徵)이 썼다.


▲ 월인석보목판(보물 제582호)/사진 문화재청 제공
월인석보목판(月印釋譜木板)은 『월인석보』를 새겨 책으로 찍어내던 판각으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 중 유일한 판목이다.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대장경이다. 석보는 석가모니불의 연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석보상절』은 조선 세종 28년(1446)에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불교서적을 참고하여 지은 것이고, 『월인천강지곡』은 세종 29년(1447)에 세종이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은 것이다.
『월인석보』는 본래 57매 233장으로 모두 24권이었으나, 현재는 권21의 46매만(181장) 남아있다. 이 판목은 선조 2년(1569) 충청도 한산에 사는 백개만(白介萬)이 시주하여 판각하고, 충남 논산 불명산 쌍계사에 보관하였다.
현재 갑사에 소장되어 있는데 70여 년 전에 입수하였다고 한다. 계수나무에 돋을새김으로 새겼고, 판목의 오른쪽 아래에 시주자의 이름과 새긴 이의 이름이 있다. 내용표기에 있어서는 방점과 글자획이 닳아 없어져 변모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불교대장경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15세기 당시의 글자와 말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국어변천을 알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관음전
관세음보살을 모신 불당을 관음전이라 한다. 관음은 자비와 사랑의 화신이다. 관세음보살을 칭명하기만 해도 모두를 해탈시켜 준다는 고난에서현실극복이다. 관음신앙은 보살신앙에서 비롯된다. 보살신앙은 부처와 범부중생의 무한 거리를 이어주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관음보살은 왼손에 봉오리 형태의 연꽃과 오른손에 감로병을 들고 연화자 위에 계신 모습이나 천수를 상징화 한 모습 등 다양한 모습의 관음상을 모셔둔다.



▲ 석조약사여래입상(충청남도 유형문화제 제50호)
석조약사여래입상은 갑사 동쪽 계곡 약 100m 지점의 자연 동굴안에 있는데, 원래는 갑사 뒷산의 사자암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머리에는 상투 모양의 머리묶음이 큼직하고 얼굴은 긴편이다. 양 어깨에 걸쳐 입은 옷은 가슴을 약간 노출시키고, 무릎 아래까지 늘어져 있다. 가슴 아래로는 반원형의 옷주름이 표현되었고, 왼쪽 어깨 부근에서는 한 가닥의 주름이 어깨너머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손모양은 오른손을 가슴까지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왼손에는 약그릇을 들고 있어 약사여래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구성미와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



▲ 갑사 표충원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52호)
표충원(甲寺 表忠院)은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승병을 조직하여 활약한 영규대사, 서산대사, 사명대사의 공을 기리기 위해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평양을 되찾는 전투에서 크게 공을 세웠고, 공주 출신의 영규대사는 최초의 승병장으로 갑사에서 승병 수백 명을 모아 참전했다.
조선 후기 공주의 학자 정규한이 쓴 글에 따르면 충청감사 이형원의 주도로 자금을 모아 순조 원년(1801)에 제향을 올리게 됐다고 한다.
곧 흥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폐됐다가 고종 31년(1894)에 복원됐다.


▲ 갑사 팔상전 (甲寺八相殿)(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54호)
갑사 팔상전(甲寺八相殿)에는 석가모니불과 팔상탱화, 그리고 신중탱화를 모시고 있다. 팔상탱화는 석가여래의 일대기를 8부분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며, 신중탱화는 불교의 호법신을 묘사한 그림으로 호법신은 대개 우리나라 전통의 신들이다.
건물 규모는 작지만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만든 공포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으로 꾸며 격식을 갖추고 있다.

▲ 대적선원

▲ 요사채
황제성 작가, 어린왕자의 동심을 화폭에 담은 'nomad-idea' 개인전 [이승준 기자] 화면 가득 채운 소설 어린왕자의 주요 소재들이 아이들에게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동심의 세계로 안내한다. 몽환적인 풍경속의 피노키오, 비행기 위에서 무심하듯 하늘을 바라보는 어린왕자의 모습은 잃어버린 순수의 세계를 되찾아 주려는 듯 동화의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자신...

 월 40㎞ 자전거 타면 5000원 쏜다!
월 40㎞ 자전거 타면 5000원 쏜다!
 창원대 의류학과 대학원생.교수, 전국 학술대회 잇단 수상
창원대 의류학과 대학원생.교수, 전국 학술대회 잇단 수상
 넥센타이어,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열어...안전의식 고취
넥센타이어, ‘안전보건경영’ 선포식 열어...안전의식 고취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에스파 첫 정규 ‘Armageddon’, 아이튠즈 美 포함 25개 지역 1위+월드와이드 차트 1위
에스파 첫 정규 ‘Armageddon’, 아이튠즈 美 포함 25개 지역 1위+월드와이드 차트 1위
 대한체육회, 파리바게뜨와 공식 후원 계약
대한체육회, 파리바게뜨와 공식 후원 계약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전시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