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 것, 그리고 변해간다는 것.
‘군위 한밤마을’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756 (한티로 2137-3) / 한밤활성화센타 054-383-0061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추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억은 기억속에 남아
그대로이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이다.
그러나, 현실은 삶이 먼저다.

돌담마을,
이름만으로도 감성을 이끄는 이름이다. 지번 상 마을 이름은 ‘대율리(大栗里)’, 우리말로 풀어내면 ‘한밤’이 된다.
한밤돌담마을을 찾았던 것이 벌써 15년, 강산이 변한 만큼의 시간동안 돌담마을의 기운도 변했다.
여전한 것은 가본 사람마다 달리 보이는 마을의 풍경 일 것이고, 달라진 것은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가 눈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마을은 삶이 머무는 공간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며, 그분들 삶의 현실인 공간이다.


빠르게 흐른 시간만큼, 마을을 찾아가는 길도 빨라졌다.
예전 같으면 팔공산 능선 한티재를 넘어 굽이굽이 돌아 넘던 길을 4km의 터널이 뚫리면서 직선의 도로를 달리게 되었다.
마을 지척에 제2석굴암이라 불리는 군위 삼존불이 있고, 마을 안에도 대율리 석불이 자리한다. 이는 마을과 종교가 함께 어울려 살았던 우리네 조상, 어르신들의 삶이 녹녹히 박힌 일상이었다. 대쪽과 같은 선비의 충절이 머무는가 하면, 아버지의 피곤한 노동이 있는 들녘이, 어머니들의 한숨이, 그 속에 행복과 영화스러움이 베인 돌담마을이다.
그 속살을 걷는다는 것은 아련한 기억을 두는 것이고, 추억을 만드는 것이다.

<대율리 대청>
신라시대에는 사찰의 종각자리였으나 폐사 되어 조선 초에 건립되었으나 임잔왜란으로 소실되었다. 1932년(인조10)에 중창 되었으며, 마을에서 서당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대소사를 논하는 마을분들의 모임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대율동중서당(大律洞中書堂)'은 100여년전 완산군 친필의 탁본이다.
그러나 오늘의 돌담마을에서는 어제 있었던 정겨움과 포근함이 그리워진다.
길에서 뵈었던 마을 어르신의 스치던 말씀이 내내 남는다.
“팔공산 터널을 뚫리고 나서 그런가, 예전 같지 않아.”
풍수에 의함인지 아니면 변해가는 마을 모습에 달라지는 사람의 모습을 말하시는 것인지...
길목 어귀 새롭게 지어진 멋진 주택이 낯설고, 마을을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불편함을 집집마다 굳게 닫힌 문들이 대신 말해주고 있다.
굳이 5시간 넘게 걸려 찾은 마을이라 하기는 마음이 무겁다.
마을의 중심 대율리 대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문을 걸어놓았다. 대청도 너른 마당에 자리하는 이유인지라 그나마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 먼 길 찾은 길손은 위안을 삼는다.

남천고택(南川古宅, 문화재자료 제357호)
한밤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물이자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상매댁(上梅宅)으로 불린다. 1836년(현종2)에 지어졌으며 이후 중수를 거쳐 왔다. 처음에는 興자의 독특한 배치형태였으나, 해방을 지나면서 안채와 사랑채, 사당이 남아 있다.

결국, 마을을 느리게 걷는 것으로 만족해본다. 작은 돌담 골목을 혼자 걷고 있음에 위안 삼는다. 더는 볼 수 없는 기억속의 돌담마을, 풍경은 추억에 담아놔야 하겠다.
마을의 조성은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950년(광덕2년)에 ‘남양홍씨(南陽洪氏)’ 시중 ‘홍란(洪鸞)’이 영남 부림현(現 경북 군위군)에 로 들어와 살면서 ‘부계홍씨(缶溪洪氏=缶林洪氏)’의 세거지가 되었고, 당시 마을 이름은 ‘대야(大夜=한밤)’였다.
이후 1390년(공양왕2)에 별시문과에 급제하면서 ‘포은 정몽주(包銀 鄭夢周, 1338~1392)’의 추천으로 ‘한림학사(翰林學士)’에 들어 ‘문하사인(門下舍人)’에 오른 ‘경재 홍로(敬齋 洪魯, 1366~1392)’선생이 1392년(조선 태조원년)초, 이성계의 위화도회군과 맞물려 문란해지는 국정에 회의를 느껴 낙향을 하였고 마을의 이름을 ‘대율(大栗=한밤)’로 고쳐 불렀으며, 부모공양과 독서로 세월을 보냈다.
같은 해 4월, 포은이 선죽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 사람도 없고 나라도 망했다.”고 탄식하며 병색이 깊어졌고, 더욱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게 되자, 선생도 세상을 뜨니 나이 27세였다.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신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이유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없으나, 대율리와 남산리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들이 남아있으며, 세월이 흐른 지금도 마을의 절반이상이 부계 홍씨다.



한밤마을의 돌담은 일부러 쌓아올린 여느 전통마을과는 다르다.
1930년대, 큰 물난리로 떠내려 온 돌들로 쌓았다. 너무 많은 강돌들이 떠내려 오니 다 치울 엄두를 못내 집집마다 담을 쌓게 된 것이다.
아래가 넓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좁아지는 형태로 사람 키 정도의 높이다.
하면, 그 이전에는 담이 없던 사촌간의 마을이었다는 것,
지금의 풍경이 오히려 지척의 인간관계를 담으로 쌓아버린 기운일수도 있겠다. 그렇게 쌓인 돌담들은 집과 마당의 크기에 따라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며 이어져 1.6km에 이른다.
마을과 집을 둘러싼 작은 석성의 모습과도 같고, 옛 집들과의 정겨움이 잘 어울리는 곳이 한밤마을의 풍경이다.




지금의 한밤마을은 먹먹하다.
풍경의 모습이 아닌 길손의 눈에 그렇다.
마을의 들머리라 할 수 있는 호두나무집. 일명 근대전시관은 굳게 잠겨있다.
부계홍씨 집안의 가장 큰 고택이자 사실상 한밤마을의 중심인 ‘남천고택(南川古宅)’은 고택숙박체험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는 판을 세워놓았다. 먼 길 마다않고 문화재를 관람하고자하는 길손에게는 그 인심이 참 매몰차다.
‘경재 홍로’선생이 나고 자랐으며 낙향하여 머물던 ‘부계홍씨종택(缶溪洪氏宗澤)’ 또한 높은 돌담과 더 높은 홍살문에 둘러싸여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다. 다만, 10대에 걸친 후손이 살아가고 있으니 그 분들의 생활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 외에도 경회재, 경의재, 경절당, 산남재, 애연당, 정일제, 교의제, 동천정등의 재실, 고택들은 모두 문을 굳게 걸어 두었다.



차라리 마을 들머리에 돌담을 둘러보는 길목마다 길 안내판을 세워 길손들의 발걸음을 한 곳으로 유도해주면 좋을 것이며, 그에 따라 마을길 안쪽으로 길손들의 차량을 유인하지 않도록 하고, 처음의 그 자리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길이라면 마을의 식당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아가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길손들의 발길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주는지는 잘 알고 있다. 늘 조심스럽고, 작은 걸음으로 다닌다.
그러나 돌담마을처럼 대놓고 막아 놓았다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길손에 대한 배려인지, 마을의 모습에 대한 손 놓고 마음 내려놓음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


대율사(大律寺)와 대율사석불입상(石佛立像)
마을과 함께 자리한 작은 절집이다. 그냥 지나치는 길이면 알아보지도 못할 작은 절집이다. 이곳 마을사람들이 미륵보살이라 부르는석불입상(보물 제988호)이 자리하고 있다.
먼 길 찾아 간 돌담마을의 풍경은 아쉬움만 가득하다.
맑은 하늘마저 쭈뼛 거리게 하는 마을의 분위기에 기 눌린 눈치가 이제 돌담마을의 한계가 온듯하다.
혹여나 추억은 기억 속에 남겨둬야 할 것만 같은 아쉬움에 못내 답답해진다.
글, 사진 자유여행가 박성환
 연천읍, “혼인.출생.전입신고하고 소중한 추억 사진으로 남기세요”
[우성훈 기자] “연천읍에서 혼인신고하고 소중한 추억 사진으로 남기세요.”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은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 내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고 스마트폰사진 무료 인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포토존 설치...
연천읍, “혼인.출생.전입신고하고 소중한 추억 사진으로 남기세요”
[우성훈 기자] “연천읍에서 혼인신고하고 소중한 추억 사진으로 남기세요.”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은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읍사무소 내 ‘혼인신고 포토존’을 운영하고 스마트폰사진 무료 인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포토존 설치...

 원도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황리 개최...170여 명 현장 면접
원도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성황리 개최...170여 명 현장 면접
 프로축구연맹, K리그 '득점 공' 경매로 판다
프로축구연맹, K리그 '득점 공' 경매로 판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독일 전기차 전문지 장거리 주행 평가서 최우수 호평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 독일 전기차 전문지 장거리 주행 평가서 최우수 호평
 aT.중진공.중부발전 등 공공기관 33곳 동반성장 '최우수'
aT.중진공.중부발전 등 공공기관 33곳 동반성장 '최우수'
 수자원공사 등 30개 투자기관, 지역균형과 물산업 성장 위해 뭉쳐
수자원공사 등 30개 투자기관, 지역균형과 물산업 성장 위해 뭉쳐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미얀마 설 맞아 문화 교류의 장 개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미얀마 설 맞아 문화 교류의 장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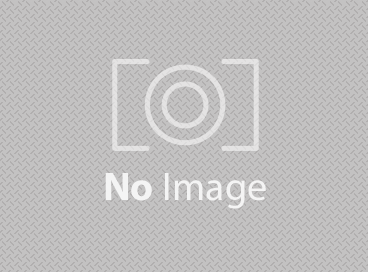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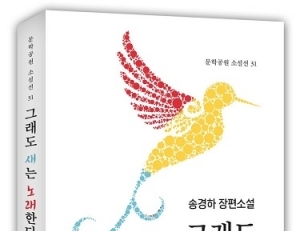 [신간] 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출간
[신간] 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출간
 카카오엔터, 美 빌보드와 'K팝 글로벌 확장' 파트너십 체결
카카오엔터, 美 빌보드와 'K팝 글로벌 확장' 파트너십 체결
 [독자기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독자기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北京 덕승문 (德胜门)의 봄!
北京 덕승문 (德胜门)의 봄!

 목록으로
목록으로




















































